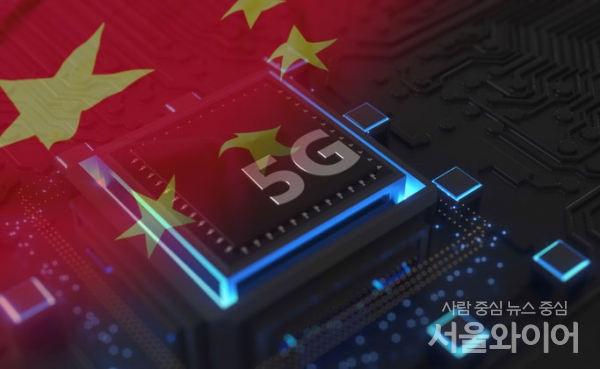
[서울와이어 손비야 기자] 백도어 논란 에서 시작된 화웨이사태가 미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과 잇달아 화웨이 5G 장비를 보이콧하면서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다.
한국 경제전문 매체 <머니S>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화웨이의 국가안전 위협 보고서'를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화권 통신장비 업체들의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왔다. 미국 상무부도 지난해 4월부터 ZTE(중싱통신)의 수출입을 중단한 이후, 점차 중화권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화웨이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영국도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뉴질랜드에서 ‘스파크텔레콤’이 화웨이 5G 장비사용을 금지한 뒤 프랑스 최대 통신 사업자인 ‘오렌지’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소프트 뱅크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심지어 이미 사용중인 화웨이 LTE 장비조차도 다른 회사 것으로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도이치텔레콤도 통신장비 도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텔레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미국의 3, 4위 텔레콤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Sprint)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모바일의 지분 64%를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텔레콤이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외국인투자자심의위원회(CFIUS)의 눈치를 봐야 한다. 게다가 스프린트(Sprint)의 대주주는 바로 화웨이 장비사용금지에 합류한 ‘소프트뱅크’다.
특히 한국은 SK텔레콤과 KT가 여론에 떠밀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LG유플러스가 과거 화웨이의 LTE 설비를 기반으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우방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부추김에 따라 화웨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에 걸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화웨이는 5년간 약 20억 달러를 투입해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추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웨이가 기밀정보를 빼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국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분석이다. 미국이 5G 기술 경쟁에서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G가 가진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장점은 많은 산업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은 이 분야에서 중국과 6개월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글로벌 5G 경쟁’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배치, 정부 정책, 상용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국의 5G 경쟁력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뒤쳐졌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한국은 3월 5G 스마트폰 출시를 기점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27개의 5G 비즈니스 계약을 따내 1만여 개의 5G 기지국을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 중에서 화웨이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18년 화웨이가 출하한 기지국 1만여 곳 중 절반은 한국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정책’ 아래 5G 분야에서 최첨단 경쟁력을 키워 5G 관련 특허 61건으로 전 세계 23%를 차지하였다. 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30%가 넘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까지 확보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국 통신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이 점차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보안 논란으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배제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가 있다. 자칫하면 중국의 IT기업이 유럽과 미국 기업에게 공습당할 우려가 있다. 중국의 IT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불공정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반중국 대열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ctormat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