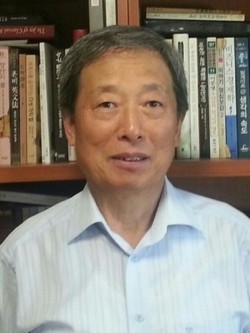
실생활에 필요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부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물부문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지원하는 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저성장·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가계와 한계기업이 고금리로 허덕이는 대가로 은행들은 우월적 위치에서 폭리를 취해가며 흥청거리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 서투른 고령자들이 단축된 은행 근무시간에 맞추느라 허둥대는데, 은행원들은 정기 급여 외에 400%나 되는 성과급을 챙기느라 신바람이 난다. 연구·개발과 치열한 경쟁으로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힘껏 박수를 쳐야 마땅하지만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떼돈을 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문제는 기업이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할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대출 ‘가산금리’의 기준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베일로 가려졌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시대에 턱없이 높은 가산금리로 말미암아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지원하기는커녕 저소득가계, 한계기업을 절망에 빠뜨린다.
가계와 기업은 빌린 돈으로 힘들게 장사를 하지만 번 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낸다. 은행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아 가는 형국이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 필수품을 매점매석해 고의로 공급부족 상황을 만들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허생이나 무엇이 다를까. 허생이 부자가 되는 반사효과로 백성들은 대가를 크게 치르고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12월 말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37%이며 총대출금리는 연 4.92%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2배를 넘어섰다. 얼마 전부터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창구지도로 대출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예대금리 배수가 이처럼 높다.
2020년 12월에는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가 0.75%, 총대출금리가 2.05%였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무려 3.07배에 이르렀다. 배보다 배꼽이 3배 이상 커다란 현기증 나는 장면이다. 그 이전에는 4배 안팎이 된 적도 자주 있었다.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은행이 정하는 예대금리 차이는 옛날 농촌 가계를 피폐하게 만든 장리벼(長利벼) 이자에 버금가는 셈이다.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만들기 전에는 이 무서운 병폐가 언제 어디서 재현될지 모른다.
과점으로 말미암은 불공정경쟁 체제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자유를 만끽한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을의 위치에서 가계와 기업은 예속된 상태나 마찬가지라 은행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해야 비로소 나의 자유가 가치 있는데 협의나 절충 없이 은행 의사대로 끌려가야 하는 고금리 대출을 진정한 금리자유화라고 할 수 있을까. 언젠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의 금융 중개기능이 우간다와 비슷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작금의 약탈적 금융행태를 볼 때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이 든다.
방만한 부실대출로 멍이 들었던 은행은 아시아외환금융위기 때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퍼부어 은행을 위기에서 구제하고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금리자유화를 유도했다. 대출 과점체제에서 가산금리를 은행 마음대로 정하게 하자 실물부문이 역으로 금융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벌어졌다.
경제구조가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금리의 고저에 따라 경제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 고금리 대출관행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짐이 돼가고 있다. 가산금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고금리 폐해를 막아야 한다. 가계와 기업이 망가지면 결국 은행도 시차를 두고 무너지게 마련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