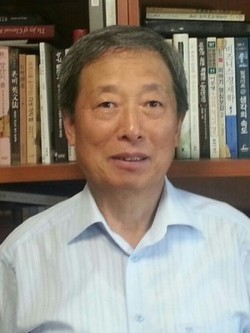
고대 그리스 법철학자 솔론(Solon)은 법이 거미줄처럼 되면 사회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심술궂은 사금파리가 날아가면 거미줄은 그대로 찢기지만 나비나 잠자리가 날아가다 걸리면 먹잇감이 되고 만다.
법망이 강자에게는 힘없이 뚫려버리고 약자에게는 무서운 갈퀴가 되면 옳고 그른 것이 없어져 글자 그대로 약육강식 사회가 돼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강자는 뒷짐을 쥐고 너털웃음을 짓지만, 약자는 이리저리 법에 채이고 밟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질서도 뒤엉켜 사회적 수용능력이 약해지고 성장잠재력이 시나브로 추락한다.
‘법의 정신’이 존중돼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법의 판결이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법이 힘 센 인사들의 은신처가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법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에 불과하다”는 ‘2022년 국민 삶의 질’ 관련 보고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질긴 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럭저럭 넘어가고, 줄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벌을 받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불안하기 쉽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5회 연속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뉴스에 황당했다. 얼마 전에는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했다는 뉴스를 보고 당황했다.
피해 학생 귀에는 “고지식하게 사는 네 아버지는 빽줄도 돈줄도 없으니 무조건 패소한다”는 엄포로 들리지 않았을까. 법조계에 오래 종사한 거물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근엄한 표정을 짓는 장면을 보며 ‘힘이 정의’인가 ‘정의가 힘’인가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두렵다.
다시 생각해보니,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밀 아닌 비밀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법이 엿가락처럼 늘어지지 않았다면 똥 묻은 돈이나 겨 묻은 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할 저명인사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5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꿀꺽꿀꺽했다는 소문이 돌겠는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겁나는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양심을 팔아먹거나 누군가의 기세에 눌려 장막 뒤에서 법을 주무르고 거래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삼척동자도 이해 못할 엉뚱한 판결을 볼 때마다 글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이나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질로잡기 위해 법의 심판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어떨까. 실제 판결과 인공지능의 판결오차가 극소화되도록, 법관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예비실험부터 우선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판결을 인공지능에게 검토시켜 ‘정의의 여신 디케’를 외면하심되는 사례들을 추려내고 이를 법조인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어떨까. 교육순서는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미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부터 시작돼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다.
만약 인공지능의 판결이 공평무사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 법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벌은 벌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정립돼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을 게다. 사건 하나에 몇 년씩 이어지는 법의 집행도 신속해져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피곤해질 게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그저 사람마다 가슴 속에 있는 양심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공지능은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