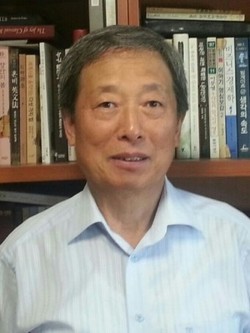
소설 대지(THE GOOD EARTH, Pearl, S. Buck)는 생명의 터전인 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칭송받으며 195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대갓집 하인인 왕룽은 인물은 없으나 지혜롭고 성실한 오란과 결혼 후 열심히 노력해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크게 들자, 오란의 제의대로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피란을 갔다. 거기서 부자가 살다가 간 빈집에서 금붙이를 주웠다. 왕룽 일가는 금을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뭄으로 헐값이 된 땅을 사들여 대지주가 돼 영화를 누렸다. 사회혼란기에 금이 가족의 목숨을 살리는 비상구 기능을 한 셈이다.
변하지 않는 화학적 성질을 가진 금은 일단 채굴되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석유나 고무 같은 것은 써서 없어지지만, 금은 주인이 바뀌기는 해도 지구촌 어딘가에 남아 있다. 중앙은행 금고에서 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가계나 기업의 금고로 자리를 옮길 뿐이지 누군가의 자산으로 남는다.
“세계 연간 금 생산량은 2500톤가량인데, 공업용 250톤 정도를 뺀 나머지만큼 지구상의 금 재고량은 계속 늘어난다.” 공업용 금도 상당 부분 재생된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소량의 금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 금의 취약점은 예금,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보유 기간이 길어도 이자나 배당금 같은 수익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다. 다른 자산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자나 배당금 또는 임대료를 할인해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무수익자산인 금은 코인처럼 그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금은 가격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고 심리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 금은 경제분쟁 발발이나 막연한 불안심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 쉽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세계경제 상호의존관계가 커가면서 그치지 않는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환율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량 팽창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고 경제성장이나 민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이 상존한다.
금 가격은 과거 상당 기간 워낙 들쑥날쑥해 물가상승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유할 가치는 크게 줄어들었다. 화폐가치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상황이라면 가치보장 수단이 될 수 있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금광을 발견한 부자들이 있었으나 금 투기로는 부자가 되기보다 가난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약간의 금을 보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금 보유는 일종의 보험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거,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 사람들의 금에 대한 집착은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사회혼란기에 화폐의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까닭이기도 하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들 국가의 금 수요 추세는 급격하게 둔해졌다. 최근 다시 중국인들의 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중앙집권 강화로 위안화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오늘날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간의 금붙이는 어쩌면 수천년 전 아라비아 왕자나 마법사 공주의 팔찌였을지 모른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돌 반지들은 아프리카 어떤 미인의 목걸이로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금은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고 그저 주인을 달리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금이 주인인가? 아니면 변해가는 사람이 주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