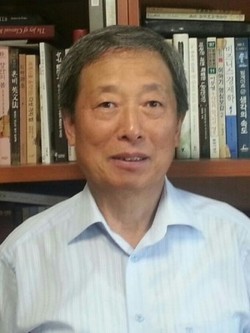
금 가격 변동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예고 지표가 되기도 하고, 역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금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이끌기도 했다. 금은 오래 보유해도 이자나 배당금이 없고 능금나무처럼 열매도 열리지 않는 무수익자산이라 내재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
가격이 이유 없이 오르다, 까닭 없이 내리는 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기에 점성술사가 아니라면 아무도 금값 향방을 점치기 어렵다. 금본위제도 폐지 후 금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금은 안전자산이기보다 투기자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서 온스당 35달러로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금값은 1971년 ‘금태환 정지 선언’ 즉 ‘닉슨 충격’(Nixon shock) 이후 거침없이 올랐다. 당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베트남 전비 조달로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달러가 미국 밖으로 많이 유출돼 아시아, 유럽에서 ‘달러 범람’(dollar glut) 현상이 벌어져 달러 가치 하락 압력이 커져 왔다.
게다가 1~2차 석유파동으로 불황 속의 고물가로 선진공업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고조되면서 1980년 1월에는 금값이 온스당 830달러 선으로 솟구쳤다. 약 10년 사이에 무려 20배 넘게 오른 셈이다.
생각건대, 금의 가치가 올랐는지 아니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지 단정하지 못한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이 넘쳐나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시달렸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에는 2차 대전 후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가 흔들린다는 우려도 있었다. 금 가격이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한편 투기 세력이 금 투기를 부추기고 있었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커(P. Volker)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공격적 고금리 조치로 인플레이션이 진화되며 금값은 바닥을 모르고 하락했다. 약 20년이 지난 1999년 8월에는 종전 최고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250달러 수준까지 추락됐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풀리며 금값은 다시 뛰기 시작해 2013년에는 최고 1900달러에 이르렀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지나가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살포한 ‘헬리콥터 머니’로 말미암은 불환지폐(fiat money)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 머니’가 풀리면서 다시 2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퍼지면서 금값은 맥을 못 추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2015년에는 종전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유동성 팽창에 따라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금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다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그 이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금값이 1800달러선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상당량의 금을 사들였는데 수수께끼였다. 아마도 세계적 유동성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한층 팽배하리라 판단하였을까.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환경에서 금이 가치보장 수단인지 아닌지는 단정하지 못한다. 금의 적정가격을 산정할 기준이 없는 데다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에 걸맞게 금을 확대 생산할 수 없기에 화폐로서 금의 기능은 오래전 수명을 다했다.
변하지 않는 화학적 성분을 가진 금 가격은 예측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나 세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한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조짐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 금값이 잠시나마 들썩인 점을 경제 논리로는 풀이하기 어렵다.
참조; 본란, 금과 금값 변동 이야기(202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