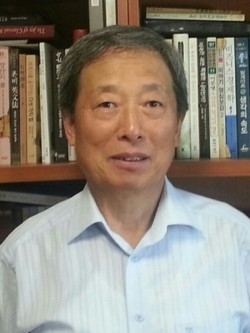
오래전 토요일 오후 광장시장 앞 양복점에 양복을 수선하러 갔다. 문밖에 앉아 있던 주인이 문을 닫고 냉방기를 틀었다. 전기료 부담 때문인지 무더위에도 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받고서야 에어컨을 켜는 마음 씀이 안쓰러워 나도 모르게 바지 하나를 더 맞췄다.
반대로 지난 해 새벽 약속시간에 늦을 까봐 허둥지둥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낫살이나 먹은 데다 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아 감사하며 살아야 할 나 자신이 민망했다.
한 때 아랍 산유국들은 전화를 무상보급하고 통신요금을 물리지 않자 불필요한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끊지 않는 바람에 전화가 자주 불통됐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차베스 대통령이 휘발유를 무료로 공급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차를 타고 나와 노상주차 하는 바람에 수도 카라카스의 교통이 마냥 뒤엉키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국고 같은 공유자원의 주인은 국민인데,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력자 마음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일도 결국 공유자원을 낭비하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
물, 전기 같은 공유자원 사용료가 저렴하다고 낭비하다보면 공유자원을 파괴하게 되어 결국 공동체 모두의 손실로 귀결된다. 개릿 하딘(G. Hardin)은 “공유지인 풀밭 사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많은 가축을 풀어놓아 풀밭이 금방 황폐화 되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공동체가 정하는 규칙이 비합리적이면 너도나도 개인이익을 위해 무임승차하려다 공유자원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려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화하면서 비롯된 유럽 에너지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값싼 전기료로 석유 값 외에는 에너지위기 무풍지대로 착각하고 전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외면하고 빈방에 불을 켜놓는 망발을 저지른 셈이다.
실제로 에너지위기가 닥치면서 “2021년부터 10개월간 전력수요가 EU국가들은 10.8%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8개월간)는 되레 4%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장기능을 무시한 전기료 인상 억제로 소비자 부담이 그리 무겁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한전 적자로 한전채를 대량 발행하자 시중금리가 요동쳤듯이 부분적 시장기능 왜곡 나비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영화 <그날이 오면(1959)>에서 경고하듯 핵전쟁이 발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불안감이 상당기간 지속되기도 했었다. 언젠가 부터는 자원낭비가 계속될 경우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구에서 동식물이 살기 어렵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가리지 않으면서도 후손들을 절망으로 이끌지도 모를 공유자원의 비극을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공유지 비극의 원인 즉 무임승차는 당장은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중장기로는 그 폐해가 사회전체에 더 큰 손실을 끼쳐 (기후)재앙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모든 재화가 다 그렇지만 특히 자원은 가격기능을 무시하지 말아야 중장기에 있어서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눈앞의 편익에 매달리지 말고 가격기능을 중시하며 에너지를 절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최빈곤층 지원은 가격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 효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