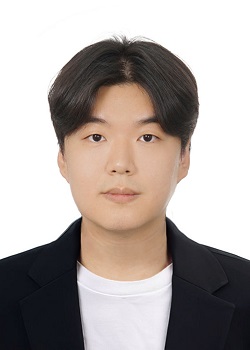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신입이 1년도 못 버티고 떠나는 산업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최근 한 철강업계 관계자의 말은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산업 전반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제는 인력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인력난이 아니다.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최근 한국철강협회가 공개한 충격적인 수치는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1차 금속제조업에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인력은 20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려 74.2%인 1536명이 신입이다. 회사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더는 못 버티겠다’며 발길을 돌린 것이다.
신입 이탈이 특히 심각한 업종은 ▲철강관 제조업 ▲압연 및 압출 ▲제강업 등 현장 중심 업종이다. 이 중 제철·제강 업종의 조기퇴사자는 30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모두 신입으로 집계됐다. 경험자도 남지 않고 신입도 버티지 못하는 산업이 된 셈이다.
철강산업의 실제 현장에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지방·외곽에 위치한 근무지, 미래 비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는 여전히 노후 설비에 의존하는 공장이 많이 있다. 일하러 오는 세대는 2020년대의 기준을 가진 MZ세대다.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실제 퇴사 사유로 64.7%가 ‘낮은 연봉’을 꼽았다. 지방 근무지(15.4%), 열악한 작업환경(14.4%)이 그 뒤를 이었다. 철강이 3D 업종(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강을 ‘주요 수출 산업’이라 부르며 포장하고 업계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하다. 지난해 철강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1만4623명 중 가장 열악한 공정으로 꼽히는 주조업에서만 300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 구조와 현장 여건이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숙련 인력의 이탈, 기술 인재 부족은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철강은 사실상 외면당했다. 철강 제품은 50%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한국 철강은 이제 미국시장에서 ‘비싸고 불리한 제품’이 됐다. 수출과 생산이 줄고 고용은 더욱 위축됐다. 결국 사람이 떠나고 시장도 떠나는 악순환이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철강업은 과연 국가 기간산업이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산업의 붕괴를 방치해도 좋은가.
현재 철강은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혹여 들어온 사람도 나가고, 남은 사람도 기로에 서 있는 산업이 됐다. 인재는 기술의 주체이자 공장의 심장이다. 사람 없이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신사업’이 아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 발표도 백화점식 대책 나열도 아니다. 당장 현장에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처방이 필요하다.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임금 현실화, 지방 근무 기피 해소를 위한 복지 인프라 마련 등 지금껏 미뤄온 기본기부터 새로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산업이 위기를 감지할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건 사람이다. 그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 이미 산업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강업의 위기는 이제 수치가 아니라 ‘현실’로 눈앞에 와 있다.
정부는 철강을 ‘주요 수출 산업’이라고 말로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력·환경·임금 구조 개선책을 내놓을 때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철강업계 역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외국인 인력 의존과 비용 절감 전략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일터의 환경 변화와 조직 문화 혁신, 기술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람이 오지 않는 산업엔 내일도 없다. 철강의 재도약은 ‘사람을 지키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 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6070억원… 불황 속 '개선세'
- [통상협상 타결] 50% 관세 장벽 여전… '수출길 좁아진' 철강업계
- 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26%↓… 동국씨엠은 적자 전환
- 현대제철, 2분기 영업익 1018억원… 전년비 3.9%↑
- 중국 감산에 철강값 반등?… 착시일 뿐, 구조적 위기 지속
- 2분기 실적 '뚝'… 미국 관세에 철강업계 '직격탄'
- 스텔란티스코리아, 부산에 지프∙푸조 통합서비스센터 개장
- 김정관 장관 "관세협상서 우리 경쟁력 높여야 할 필요성 뼈저리게 느껴"
- '50% 고관세' 위기의 철강업, 'K-스틸법'으로 숨통 트이나
- [기자수첩] 이춘석 의원, 국회와 국민에게 무얼 남겼나
- [기자수첩] 소비쿠폰의 어두운 이면 ‘담배깡’
- [기자수첩]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면의 민낯
- [기자수첩] 하늘 위 비상구, 편안함을 판 대가가 너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