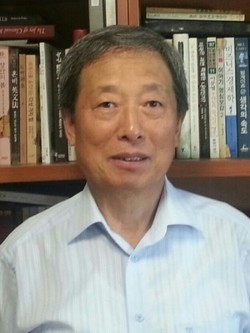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이전, 한국의 종금사들은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와 금리가 비싼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줘 금리차액을 챙기며 흥청망청 거렸다. 처음에는 손쉬운 만기연장으로 소위 엔 캐리트레이드(Yen carry trade)로 짭짤한 수익을 내며 신종 금융기법인양 으스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그림자가 동남아로부터 동진하면서 일본이 채권 회수 속도를 빠르게 하며 ‘리볼빙’을 거부하고, 동남아 국가로부터 채권을 반환받지 못하자 기진맥진해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은 고금리로 동남아에 직접 돈을 빌려줄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지불불능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었던 한국에 단기로 자금을 빌려줬다. 이자를 낮추는 대신에 부도위험을 한국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꾀를 부렸다.
그 대가로 한국은 재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duration mismatch) 위험을 대신 떠안아 결국 아시아외환금융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꼴이 됐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정적 패착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현상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SVB는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하자 예금을 받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뒤이을지 모를 금리하락을 속단하고 장기채권을 매수하여 수익을 크게 내겠다는 욕심을 부렸다.
그들의 예상과 반대로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확대되고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초고속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산상태로 돌입했다.
상당수 가계와 기업은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만기가 길수록 누적될 이자가 금리 수준에 따라 할인되기 때문에 채권가격의 급등락 위험이 커진다. 10년 이상 잔존기간이 긴 채권의 경우 주식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장기채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 변동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위험관리에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물가를 잡으려다가는 경기후퇴, 나아가 경제위기 그림자가 덮칠 우려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려다가는 인플레이션 악령이 휘몰아칠까 두려워 금리 향방을 속단하기 어렵다. 세계 곳곳에 돈이 너무 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유자산 ‘장단기구조’를 조화시켜야 한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조정하는 일은 개인과 기업의 자산관리에서도 절대 중요하다. 이를테면 어떤 그룹회사는 제도화되지 않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로 자금을 조달해 초고층빌딩을 짓다가 정부에서 환매조건부 매매를 금지하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부도사태에 마주쳤다. 또 부동산 열기를 틈타 남의 돈을 빌려, 갭투자까지 한 가계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흔들리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만기구조를 감안하지 못하면 금리인하와 가격회복을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끝없는 유동성 팽창에 따른 화폐가치 타락 현상이 지금처럼 끈끈해지리라고 짐작하기 어려웠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몰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통화팽창과 재정적자에 따른 후유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금융시장 장기추세는 대강 짐작할 수 있어도 변화무쌍한 시대에 돌발변수를 어떻게 예측하겠는가.
다시 말해 2023년 현재 어느 누구도 금리 향방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선제적 안내를 하겠다며 오도된 신호를 섣불리 시장에 보내다가는 SVB처럼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어떤 조치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같은 미래 예측에 가까운 선언효과(announcement effect)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