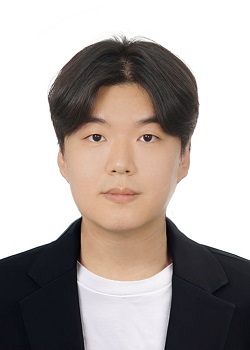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지연 안내: 인천행 OO편,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안내판 앞에 선 승객들의 한숨이 낯설지 않다. 공항에서 ‘지연’이라는 두 글자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일상이 됐다. 그러나 늘어나는 지연에 비해 보상과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승객들이 손에 쥐는 건 잃어버린 시간뿐이다.
최근 대한항공은 한 달 새 두 차례 승무원 지각으로 비행기를 세웠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여객기는 현지 도로통제와 교통사고로 승무원 차량이 늦어지며 출발이 46분 지연됐다. 불과 2주 전 필리핀 세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90분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별도의 보상이나 사과는 제한적이었고 승객들에게 돌아온 건 ‘교통 사정 탓’이라는 짧은 안내뿐이었다. 국제선 특가 항공권을 손에 쥔 승객들이야 지연에 익숙하지만 ‘국가대표 항공사’의 승무원이 승객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은 달리 읽힌다. 기본 신뢰의 문제다.
저비용항공사(LCC)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다. 에어서울은 오사카발 인천행 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29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됐다. 하루에도 수십 편이 오가는 노선에서 대체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승객들을 공항과 호텔에 장시간 묶어뒀다. 일부 승객만 다른 항공사 편으로 나눠 귀국했고 나머지는 25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한국 땅을 밟았다. 항공사가 책임 있게 대체편을 마련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기다림이었다. 값싼 항공권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승객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에어부산의 사례는 또 다른 풍경이다.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항공편은 기체 이상으로 도착지를 인천으로 변경했다. 승객들은 새벽 시간 버스로 이동해 김포공항에 닿았다. 당연히 “보상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돌아온 답은 “안전 점검에 따른 지연은 규정상 면책”이라는 단호한 설명뿐이었다.
항공사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늘 ‘안전 운항’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연이라면 그에 걸맞은 대체편 투입이나 신속한 안내, 합리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승무원 지각이 불가항력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보여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전은 지켜지지만 승객 보호는 늘 뒤로 밀린다.
문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올해 1~7월 지연율은 29.3%. 항공기 10대 중 3대는 제시간에 뜨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내 항공사별로는 에어서울이 상반기 지연율 36.5%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역시 20%대 후반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하늘길이 정상화되며 운항 편수가 급증했지만 공항 혼잡과 기후위기, 정비·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연은 일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제선 지연 2시간 이상부터 배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면책 사유가 워낙 넓어 실제 보상은 제한적이다. 결국 승객은 항공사에 따라 들쭉날쭉한 대응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같은 지연 상황이라도 항공사마다 대응 방식과 보상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항공사는 “우리가 고의로 늦는 건 아니다”고 해명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을 빼앗겼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다. 게다가 지연의 배경에는 비용 절감 압박, 과밀한 운항 일정, 정비 여력 부족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
하늘길은 다시 열렸고 공항은 여행객으로 붐빈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제때 뜰 수 있느냐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금 필요한 건 작은 약속이다. 승객보다 늦지 않게 도착하는 기본, 지연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태도다. 그 출발선에 설 때 비로소 ‘안전 운항’이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