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은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줄임말로, 어려운 경제 용어나 금융 상식을 독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전달하는 코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와 똑똑한 경제 습관을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요즘 시장을 읽는 열쇳말 가운데 하나가 장단기 금리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 금리와 만기가 긴 장기채 금리가 만들어내는 곡선의 모양은 경기와 정책 기대, 위험 선호를 한데 묶어 보여준다. 특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끝나고 정상 구간으로 되돌아오는 해소의 순간은 과거 여러 차례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지금은 바로 그 전환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국내 금리 구간도 변화의 단서를 던진다. 이달 1일 기준 국고채는 3·10년 구간이 고점을 경신하는 반면 30년물은 되밀리며 구간별 엇갈림을 보였다. 3년물 2.596%(+1.4bp, 3월28일 이후 최고), 10년물 2.960%(+0.9bp, 지난해 11월22일 이후 최고)로 단·중장기 금리가 올라선 반면, 30년물은 2.829%(-1.2bp)로 하락했다.
기준금리(2.50%)와 3년물 간 스프레드(금리차)는 9.6bp(1bp=0.01%포인트)로 2023년 11월28일 이후 최대폭으로 벌어졌고, 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는 36.4bp로 소폭 축소됐다. 30년물과 10년물 구간은 역전 폭이 13.1bp까지 확대되며 초장기~장기 구간의 ‘플래트닝(평탄화)’ 압력을 재확인했다. 선물시장에서는 3년·10년물이 약세(가격 하락)였고, 30년물은 강세(가격 상승)로 마감해 현물 움직임과 방향을 같이했다.
채권은 주식처럼 지분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계약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우상향 곡선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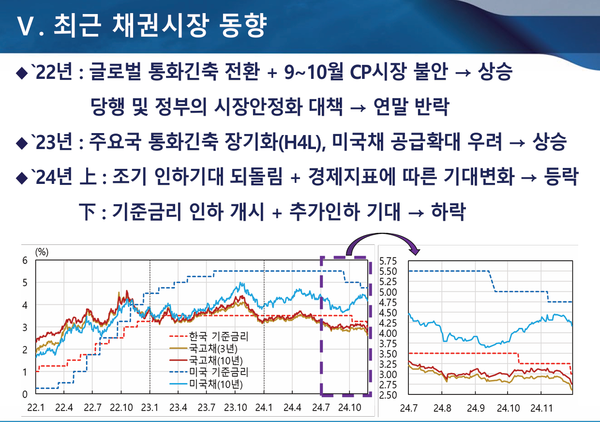
하지만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는 한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구도가 달라진다. 단기 구간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붙들리고, 장기 구간은 안전자산 선호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금리가 낮아진다.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할 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역전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대목은 역전 그 자체보다 그 이후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 역전이 해소된 뒤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둔화가 찾아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1990년, 2001년, 2007년, 2020년 등 여러 국면에서 역전 해소 후 수개월에서 1년 남짓 지연된 신호가 실제 경기 하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장단기 금리를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한다. 큰 사건 이전에 먼저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라는 뜻이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역전의 깊이와 길이가 유독 컸다는 점이다. 미 국채 2년물이 10년물을 100bp 넘게 웃돈 구간이 있었고, 역전 기간도 장기화됐다. 이후 2024년 8월 말에 이르러 역전이 해소됐고, 지금은 그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민감한 구간에 들어선 셈이라 금리 신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책 환경은 더 미묘하다. 연준은 고용 둔화 리스크를 인식하면서도 물가에 대한 경계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가까운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이후 추가 인하 기대를 동시에 가격에 담아내는 중이다.

한쪽에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한쪽에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지표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런 때 장단기 금리는 더욱 민감하게 흔들린다. 단기는 정책 기대에, 장기는 경기와 물가의 미래 경로에 반응하면서 곡선의 기울기가 수시로 바뀐다.
투자 관점에서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유효하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만기가 길수록 가격이 금리에 더 크게 반응한다.
현금흐름 수요가 가까운 자금이라면 단기채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는 편이 낫고, 더 긴 시간과 변동성 감내가 가능하다면 장기채의 듀레이션(채권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가중평균한 ‘평균 회수기간’으로, 금리 1%포인트 변동에 대한 가격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을 활용해 금리 하락 구간의 탄력을 노려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들고 간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이 맡을 역할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주식 변동성을 완충할 방파제가 필요한지, 금리 방향성에 베팅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지금 시장은 역전에서 해소로 넘어온 뒤의 균형점을 찾는 중이다. 경기 둔화가 뒤따를지, 연착륙의 확률이 높아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사이클의 역전 강도와 기간이 과거보다 컸다는 사실, 그리고 해소 이후의 구간에서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의 변곡이 많았다는 기록은 기억해둘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