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드, 뉴욕 연계성 부각하며 공세 재점화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메이도프 펀드 환수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던 메리츠화재가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파산관재인 어빙 피카드가 보충 주장을 앞세워 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메리츠의 투자 경위와 책임 범위를 다시 따지는 국면으로 확산됐다.
◆ 보충 주장으로 공세 강화…환수 논리 정면충돌
2014년 12월 미국 뉴욕주(州) 남부 연방파산법원이 ‘초국경성(Extraterritoriality)’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로 하면서, 파산관재인 어빙 피카드에게 소장을 보완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엔 단순 해외 거래 여부만 따지는 단계에서 벗어나 메리츠가 어떤 경로로 메이도프 펀드와 연결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지했는지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피카드 측은 2015년 6월 27일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며 메리츠화재가 사실상 미국 내에서 이뤄진 거래에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문서에 따르면 피카드 측은 메리츠가 해외에 설립된 피더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 뉴욕을 중심으로 한 금융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돼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충 진술서에서 피카드 측은 메리츠 관계자들이 2006년과 2007년 뉴욕에 위치한 페어필드 그리니치 그룹(Fairfield Greenwich Group) 사무소를 방문해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뉴욕에서 전화 회의가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메리츠가 메이도프 펀드와 직접적인 연결 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조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피카드 측은 메리츠가 맺은 투자계약에 뉴욕 법 적용과 뉴욕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메리츠가 투자 초기부터 뉴욕을 분쟁 관할지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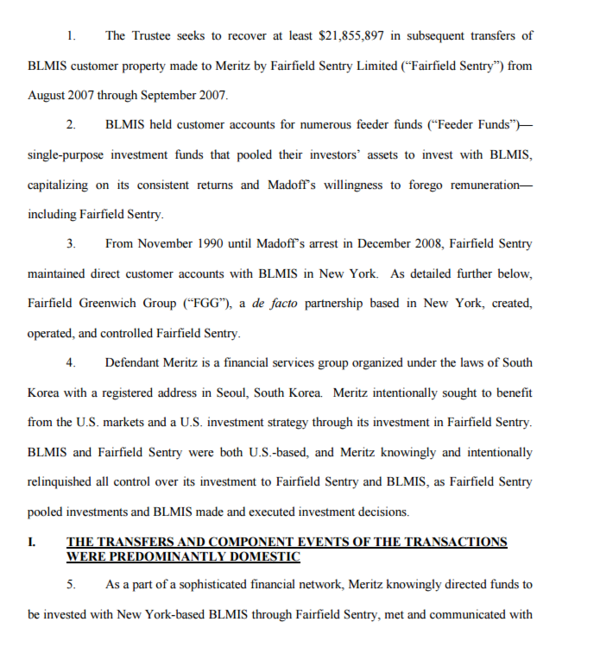
송금 경로 역시 논리의 핵심이었다. 피카드 측은 메리츠가 투자금을 이체할 때 HSBC 뉴욕 지점을 통해 자금이 흘러갔고, 최종적으로는 JP모건 뉴욕 계좌에 있던 메이도프 증권사(BLMIS)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페어필드 센트리(Fairfield Sentry)가 서류상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뉴욕 본사에서 이뤄졌으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카드 측은 메리츠의 투자는 국외거래가 아닌 미국 내 거래(domestic transaction)로 봐야하기 때문에 명백한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리츠가 2007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185만 달러(약 304억원)를 환매받은 것 역시 문제 삼았다. 피카드 측은 환매금이 합법적 투자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메이도프 사기 구조에서 흘러나온 피해자들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세에 맞서 메리츠도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 2016년 7월 5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메리츠는 기존 로펌이던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 LLP)을 해임하고 변호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 햄프턴(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를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 종결 대신 재점화…항소심으로 번진 사건
현지시간 2016년 11월 22일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파산법원은 메리츠를 상대로 한 피카드 측의 환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뉴욕을 경유했다고 하더라도 메리츠와 페어필드 센트리 간 거래 자체는 해외에서 체결·집행된 것”이라며 “이를 미국 내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카드 측이 강조한 ‘뉴욕 연계성’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메리츠의 계약에 뉴욕 법 적용과 관할권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외 거래를 미국 파산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메리츠가 환매받은 금액 역시 정상적인 투자 환급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환매는 정상적인 투자 환급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사기에 가담했다거나 특별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메리츠 사건을 기각하고, 2017년 3월 3일 ‘최종 명령(Stipulated Final Order)’을 내려 사건 종결을 공식화했다.
피카드 측은 곧바로 상급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카드 측은 메리츠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기각된 다른 해외 금융기관 사건들과 함께 묶어 제2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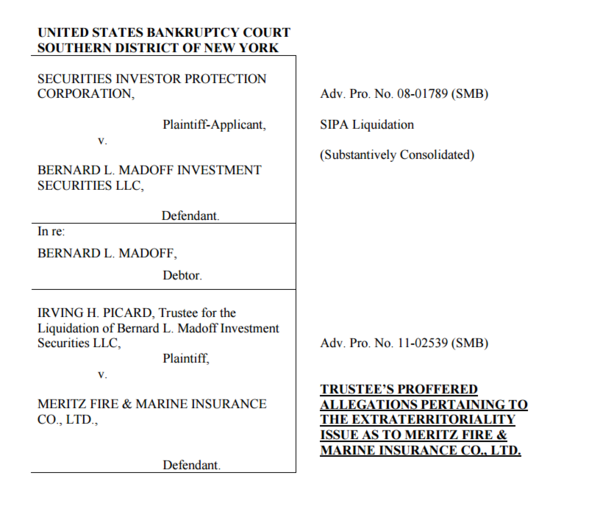
피카드 측은 항소장에서 “자금이 해외를 거쳐 최종 수취자에게 전달됐더라도, 출발점은 뉴욕에 있는 메이도프 증권사(BLMIS) 계좌였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내 행위다. 해외 금융사라고 해서 환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리츠의 투자와 환매 과정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친 형식일 뿐, 실제로는 뉴욕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재차 지적했다. 계약 조항에 뉴욕 법과 관할권을 명시한 점, 송금 과정에서 HSBC와 JP모건의 뉴욕 계좌가 사용된 점을 다시 부각시키며 외형만 해외일 뿐 실질적인 국내 거래(domestic transaction)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리츠가 해외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환수 소송에서 배제한다면,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리츠와 같은 해외 금융사들이 대규모 환매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누렸다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송은 다시 항소심 단계로 넘어갔다. 메리츠는 2016년 말 파산법원의 기각 판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은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게 됐으며, 메리츠와 함께 기각 판결을 받았던 다른 해외 금융기관들 역시 동일한 쟁점으로 심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