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PE 웹소크, 실시간 통신 구조 문제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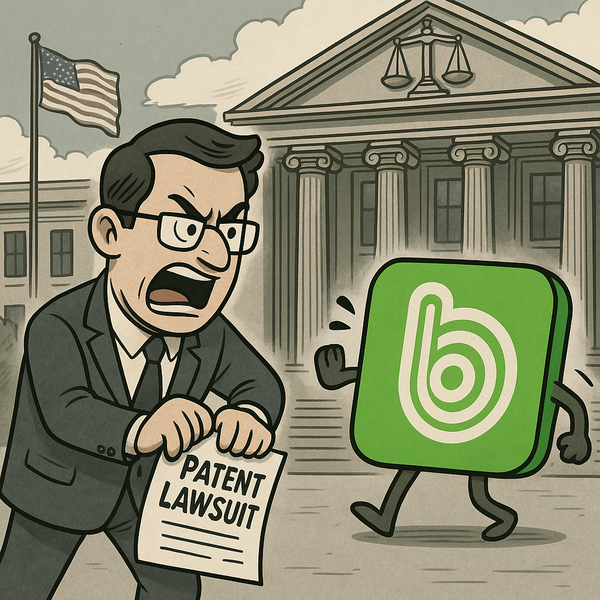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네이버의 커뮤니티 플랫폼 '밴드'가 미국에서 실시간 통신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곳은 자체 제품 없이 등록 특허를 통해 수익을 내는 미국의 대표적 특허관리회사(NPE)인 웹소크(WebSock Global Strategies)다.
현지시간 4일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웹소크는 네이버 '밴드'가 자사의 미국 특허 제7,756,98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실시간 메시지 처리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밴드의 통신 구조 전반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웹소켓(WebSocket)'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간 실시간 통신 기술이다. 이 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서버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다. '밴드'에서는 채팅, 실시간 댓글, 알림 기능 등에 폭넓게 사용됐다.
웹소크는 '밴드'가 실시간 메시지 전송을 위해 비동기 방식의 데이터 송수신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사 특허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메시지 큐, 연결 유지 방식, 서버 응답 지연 처리 등에서도 침해 요소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밴드' 뿐 아니라 현대 웹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기술이다. 웹소켓 구조는 구글의 지메일과 문서도구, 메타의 메신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슬랙, 넷플릭스의 시청 데이터 반영 시스템, 아마존의 실시간 배송 추적, 트위터의 타임라인 및 알림 처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서비스에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술 보호보다는 다양한 기업을 겨냥해 라이선스 수익을 얻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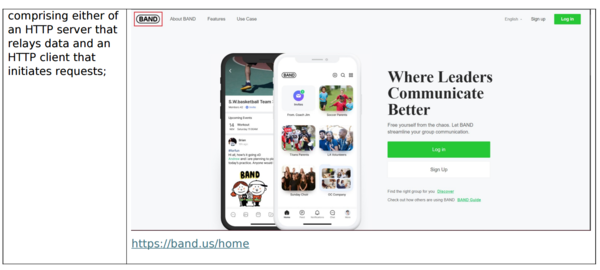
◆왜 '밴드' 노렸나… 중견 플랫폼 노린 전략적 소송
NPE들은 일반적으로 소송 위험과 방어 비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조기 합의나 라이선스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한다. 실제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견 IT 기업들이 주된 타깃이 된다.
업계에서는 웹소크가 네이버를 겨냥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네이버의 '밴드'는 북미,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꾸준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메신저, 피드,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실시간 통신 기능이 결합된 복합 플랫폼이다.
여기에 더해 밴드는 미국 내 트래픽이 일정 수준을 넘는 대표적인 한국산 앱으로, 웹소켓 기반 구조도 뚜렷이 드러나는 서비스다.
웹소크는 과거에도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여러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는 콘텐츠 스트리밍 및 API 캐싱 기능, 어도비(Adobe)는 협업 도구 어도비 커넥트(Adobe Connect)를 통해 피소됐다. 또한 포스트맨(Postman)은 API 테스트 자동화, 푸셔(Pusher)는 실시간 알림 브로드캐스트, 보내지(Vonage)는 음성과 메시징 API, 복서넷(VoxerNet)은 워키토키 기반 음성 메시징, 디스코드(Discord)는 음성과 채팅이 결합된 커뮤니티 기능에서 각각 웹소크의 특허 침해 주장에 직면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소 제기 수개월 내 비공개 합의나 자진 철회로 종결됐다. 실제 재판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소송을 걸어 상대를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특허괴물'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해석도 있다.
◆ 무효심판부터 반소까지…국내 기업의 NPE 대응법
네이버 외에도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은 과거 다양한 특허괴물들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대표적 대응 방식은 무효심판, 반소, 전략적 합의의 조합이다.
삼성전자는 LTE 표준특허를 주장한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와의 소송에서 일부 특허를 무효화하고 나머지는 협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LG전자는 시스벨(Sisvel)의 Wi-Fi 특허 소송에 비공개 합의로 대응했고, SK하이닉스는 DRAM 인터페이스 기술을 두고 넷리스트(Netlist)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서 장기 소송 중이다.
카카오도 실시간 통신 관련 특허를 주장한 유니록(Uniloc USA)과의 분쟁에서 일부 무효심판을 통해 승소하고, 결국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네이버 대상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실체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특허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겹치는 만큼, 향후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둘러싼 핵심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네이버·SKT·엔씨·업스테이지·LG, 초거대 AI '국가대표' 확정
- 국산 초거대 AI 누가 만들까… 정부, 10개 정예팀으로 압축
- 네이버·KBS, AI 동맹 맺고 'AI 방송 시대' 공동 대응 나선다
- 개인정보위, 카카오·네이버 등 슈퍼앱에 개인정보 처리 개선 권고
- 네이버,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위해 성금 10억원 기부
- 카카오, 광복절 맞아 '톡 안의 태극기 챌린지'… 기부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는다
-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300만대 판매
- 네이버, 스페인 최대 C2C 플랫폼 '왈라팝' 인수
- 카카오, 2분기 영업익 1859억원… 전년比 39%↑ '역대 최대'
- 네이버, 2분기 매출 2조9151억원… 전년 比 11.7% 증가
- LG전자, 구독 사업 글로벌 확대 가속화…동남아 진출
- [Biz&Law] 삼성전자, 넷리스트 美 ‘수입금지’ 공격에 방어 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