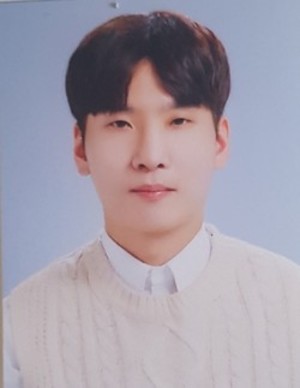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과거 철강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포스코그룹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룹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냈다. 실제 주력인 철강 외 이차전지와 소재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는 글로벌 시장으로 비상하고 있지만 안팎 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외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우 회장이 올해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잇따라 초대받지 못하면서 정부와의 불화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이런 풍문은 증폭하고 있다.
어떤 측면서 봐도 포스코와 현 정부의 관계는 소원해 보인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올해 재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위상을 높였으나, 총수인 최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포스코의 입지나 최 회장의 경영 실적을 보면 정부에서 왕따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포스코는 양·음극재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우며 첨단산업 육성 등의 정부 비전에도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최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포스코의 ‘흑역사’를 상기시킨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중장기 전략 실행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스코는 민간기업으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포스코가 경영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 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다. 연임 여부는 이뤄낸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더 나은 경영자가 있다면 물갈이를 할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KT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선임이 외풍에 의해 흔들리는 황당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기자수첩] 양평고속도로,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 안된다
- [기자수첩] 출생통보제로 부족하다… 보호출산제 조속히 통과 돼야
- [기자수첩] 아스파탐이 발암물질? 공포감 조성 말아야
- [기자수첩] 흐지부지된 반지하 대책, 폭우 막을 자신있나
- [기자수첩] '유령 아동' 사태… 정부, 신속히 근본 대책 내놔야
- [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도 식당선 그대로, 외식물가는 언제쯤
- [기자수첩] HMM 민영화, 급할수록 신중해야
- [기자수첩] 결국엔 "먹어도 된다" 혼란만 가중시킨 WHO
- [기자수첩] 제약업계 고질병 '담합' 고치려면 '솜방망이' 처벌 사라져야
- 포스코, 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표명 전망… 연임·퇴진 '갈림길'
- 포스코 최정우, 침묵 속 3연임 도전 개시… 용산·장기집권론 넘어야

